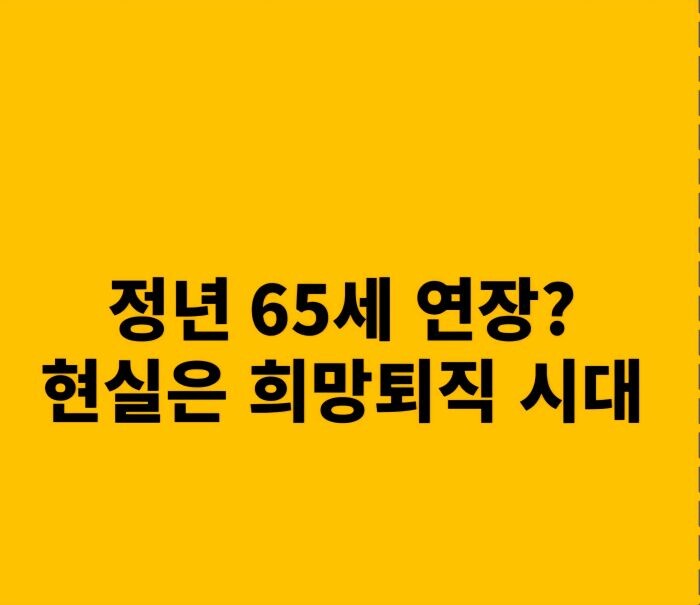
이슈앤/ 고령화 사회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한국의 노동 시장은 '정년 연장'과 '희망퇴직'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축을 중심으로 역설적인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와 국회는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 제도 도입을 논의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경영 환경 악화를 이유로 희망퇴직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정년 연장의 '기대감'이 낳은 주춤-
현재의 정년 연장 논의는 근로자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안전망으로 작용한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65세)과 법정 정년(60세) 사이의 간극을 메워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고령 근로자들이 섣불리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자발적인 희망퇴직 신청은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 있다.
이는 제도가 공식화되지 않았음에도, 논의 자체만으로 노동 시장의 미묘한 흐름을 바꾼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이 무색하게, 기업의 현실은 냉정하다.
디지털 전환과 경기 불황이 맞물리면서, 특히 금융권과 대기업에서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의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그 대상이 40대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노후 대비 지원'이 아닌, 인건비 절감을 위한 강제적 인력 감축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정년 연장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리스크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고비용 구조를 유지해야 하므로, 기업들은 정년 연장 논의가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고연령 고임금 인력을 줄이는 '인력 구조의 슬림화'를 서두르고 있다.
따라서 희망퇴직은 논의와 관계없이 가속화될 여지가 높다.
-해법은 '유연성'과 '공정성'-
결국 이 역설적인 상황을 해소할 열쇠는 임금 및 고용의 유연성과 세대 간 공정성에 달려 있다.
정년 연장 법제화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전제로 해야 한다.
단순히 고용 기간만 늘린다면 청년 고용 축소와 기업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다.
정년을 일괄적으로 늘리기보다,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등 기업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계속 고용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고령층 고용 안정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상충되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고령사회의 필연적인 과제다.
그러나 그 논의가 기업의 선제적인 인력 감축을 부추기는 역설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실적인 임금 구조 개혁이 전제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
그렇지 않다면 '정년 연장'이라는 희망의 구호는 '희망퇴직'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이슈앤 = 김창권 대기자]




